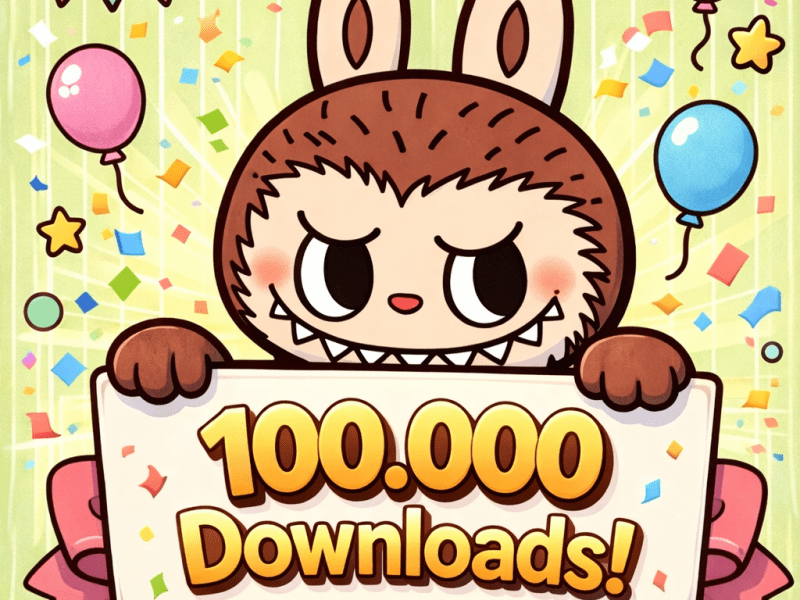외부와의 소통을 좋아하지만, 소통에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은 나머지 몇 년 동안 바깥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고 살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몇 년만에 바깥에 나와 보니 MVP니 PMF니 하는 잘 모르는 용어가 세상을 여기저기 날아다니고, 커피 챗(Coffee Chat)을 통해 채용을 시도하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었지요. 그래서 이 짧은 생각인 단상(短想)을 펼쳐보게 되었습니다.
인터뷰 자리에서 우리는 MVP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제 머리 속의 MVP는 Most Valuable Player/Person일 따름이었습니다. 지금이야 Minimal Viable Product로도 머리로는 인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입에 잘 붙지 않는데, 그 와중에 또 MAP라는 것이 있다고 그걸 만들어야 한다고 외치는 팀원들이 있었지요.
하지만 그들은 그 순간까지도 MAP는 커녕 제대로 된 MVP조차 내놓은 적이 없었고, 마치 초짜 개발자가 뭔가 조금 만들다가 때려 치우고 또 좋아 보이는 다른 것을 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였지요. 듣자하니 그들은 또 기존의 것을 부수고 새로 뭔가를 만든다고 하더군요.
SK Communications에 다니던 시기에는 커피 챗 대신에 캔 미팅(Can Meeting)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커피 캔을 하나씩 뽑아 들고 나가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미팅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지금은 조직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커피 챗이 이를 대체하고 있는 것이겠고요.
사실 커피 챗이 채용 프로세스에 포함된 경우, 제대로 이를 실행하는 조직은 아직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많이 언급하시다시피 형식이 캐주얼할 뿐이지, 해당 미팅의 본질은 인터뷰이자 채용 프로세스의 일부여야만 합니다. 캐주얼한 대화니까 채용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당신과 이야기나 하고 싶다고 하면, 안 그래도 마음이 급하고 바쁜 취업 대상자에게서 귀중한 시간을 뺏어 보겠다는 것밖에 안 되니까요. 5년 전에 한참 푸드 디스펜서를 개발하고 있던 모 업체에서 불러서 갔는데, 자기들 듣고 싶은 이야기만 3시간을 듣고 나서는, 그 이후에는 메일에 답신은 커녕 전화를 해도 안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인터뷰를 하는데 스타벅스에서 만나자고 하기에, 만나서 오피스로 이동하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요. 그 사람 많은 퇴근 시간에 강남에 위치한 스타벅스 한가운데에서 인터뷰 같지도 않은 인터뷰를 한 경험도 있습니다. 이는 사실 인터뷰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기 십상이고, 오피스를 보여 줄 생각이 없고, 당신이 뭔가를 보여 주기 전에는 우리 근처에도 오지 말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나 아무 것도 할 줄 모른다하고 나오면서 지원 취소 버튼을 깔끔하게 눌렀습니다.
반면에 다른 금융 관련 업체에서 커피 챗을 요청해서 방문했을 때는, 상대방이 사실 이런 커피 챗 형식으로 인터뷰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하시면서 저를 배려하는 모습이 항상 느껴졌고, 결과적으로 세 분과 함께 무려 네 시간 동안이나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나온 경험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최종 오퍼를 받아 놓고도 가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도 필요하다면 이야기를 자주 나누기로 했습니다.
커피 챗의 형식이 어떻건 간에 서로 균형이 맞지 않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나눈다면 그것을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채용 인터뷰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조직 내에서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에 휘둘리다가 잘못하면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훈계가 될 수도 있고, 결국 지시가 되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항상 마음 속에 담아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커피 챗(Coffee Chat)은 커피를 마시면서 하는 업무 미팅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어 주는 것 없이 이야기만 나누어도 되는 잠담도 아니라는 것은 저 혼자만의 짧은 생각(단상)은 아닐 것입니다.